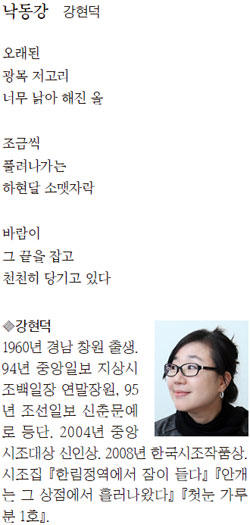
가락의 동녘을 흐르는 큰어머니 같은 강, 낙동강은 그 어머니의 애가 묻어나는 강이다. 풀꽃과 새들을 낳고 기르는, 허리 긴 그 강 깊숙이 뱃길을 열고 어망을 던지며 사람들 또한 자연의 일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구비 많은 강을 사수하느라 비바람 눈보라를 마다하지 않았을 강마을 사람들은 이제 늙고 기운 없는 강을 속절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것인가.
강은 ‘너무 낡아’ 올이 다 해진 ‘광목 저고리’ 같다. 그 저고리 소맷자락처럼 ‘풀려나가는 하현달’과도 같다. 그런 강 물살을 ‘바람’이 ‘천천히’ 잡아당기고 있는 중이다. 숯불 같은 노을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목숨이 익어가던 뜨거운 시간은 어디로 묻힌 것이며, 세상에 젖을 물리며 불어나던 더운 가슴은 얼마나 내려앉은 걸까.
이미지의 성공작이다. 저고리와 하현달과 바람으로만 직조한 완미한 이 시에서 언술은 한낱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미지와 이미지의 행간에 동원된 상상력만이 아메바처럼 무한 증폭으로 번지고 있을 뿐이다. 위태로운 시간의 소매를 당기는 바람이야말로 시 전편을 그물처럼 감아쥐고 있지 않은가. 풀려나가는 하현달 소맷자락을 천천히 당기는 동작을 통해, 세월이란 바람이 역사라는 강을 어떤 속도로 잡아당기고 있는지를 일러주는 것도 같다. 강의 낡고 창백한 육신은 보존의 가치를 저버린 개발의 광포한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비친다. 강은 강답게 흘러야 몸빛이 날 터이다.<박명숙 시조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