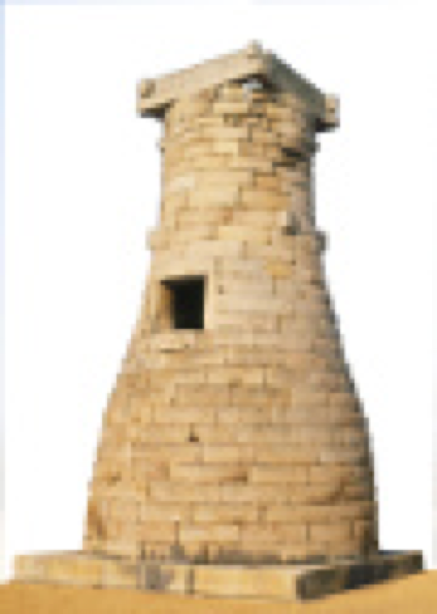題文殊騎牛圖
-朴瑞生
長裾垂地獨騎牛(장거수지독기우) 긴 옷자락 땅에 늘어뜨린 채 혼자 소 타고 있노라니
鬚末淸風滿天地(수말청풍만천지) 수염 끝 맑은 바람 온 천지에 가득하고
放下繩頭緩緩歸(방하승두완완귀) 고삐 놓은 채로 느릿느릿 돌아오노라니
溪橋碧草煙華膩(계교벽초연화니) 시냇가 다리에 푸른 풀, 안개에 살짝 가려있구나
裾:옷자락 거 ① 옷자락 ② 거만하다 ③ 옷의 뒷자락 ④ 옷깃
장거(長裾), 즉 긴 옷자락은 한나라 추양(鄒陽)의 고사다. 추양이 옥에 갇혔을 때 오왕(吳王) 유비(劉濞)에게 글을 올렸다. "고루한 내 마음을 꾸몄다면 어느 왕의 문이건 긴 옷자락을 끌고 다닐 수 없었겠습니까?(飾固陋之心, 則何王之門, 不可曳長裾乎)" 아첨하는 말로 통치자의 환심을 살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긴 옷자락은 추양의 도도한 변설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2/2016020203864.html]
繩頭:끈·새끼·밧줄 따위의 끄트머리
膩 기름 니:① 기름 ② 매끄럽다 ③ 때 ④ 물리다
박서생 (朴瑞生)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 | 생애 및 활동사항 본관은 비안(比安)이며 자는 여상(汝祥), 호는 율정(栗亭)이다. 할아버지는 박윤보(朴允甫)이고, 아버지는 중랑장(中郎將)을 지낸 박점(朴漸)이다. 『국조방목(國朝榜目)』에는 박서생을 야은(冶隱)길재(吉再)의 문인이라 하였는데, 그는 길재의 행장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1401년(태종 1)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1407년(태종 7) 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여 우정언에 제수되었다. 박서생은 이후 응교·집의 등 주로 언관직에 종사하였다. 특히 1420년(세종 2) 집의로 재직할 당시 상왕인 태종의 행차를 막고자 언론을 펼쳤다가 상주로 유배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공조참의·병조참의·집현전 직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박서생은 1428년(세종 10)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는데, 이때 수차(水車)의 이점과 그 도입을 건의해 농사기술의 혁신을 가져왔다. 아울러 그가 보고한 일본의 정세와 왜적의 동태는 이후 조선이 일본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서생은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으며, 1714년(숙종 40)에 건립된 구천서원(龜川書院, 의성군 구천면 산구동에 소재)에 박의중(朴宜中), 이우(李瑀), 김효정(金孝貞) 등과 함께 배향되었다. 1898(고종 35)년에는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용천리에 ‘박서생 사적비’가 건립되었다. 비문에는 박서생의 학풍, 야은 길재와의 관계 등 박서생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모가 심한 편이다.
참고문헌
- 『국조방목(國朝榜目)』
- 『세종실록(世宗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율정 박서생의 생애와 사상」(김보정, 『영남학』31, 2016)
- 「율정 박서생의 학문적 연원과 세종대 수차 도입론」(김형수, 『석당논총』6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