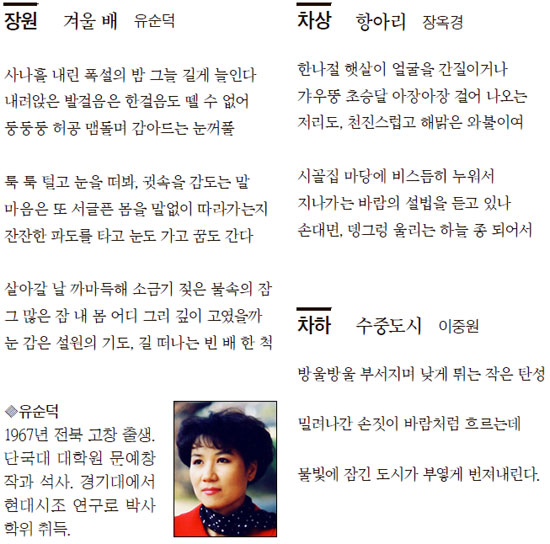
겨울의 초입, 이달에는 나름의 사유와 성찰에 주력한 작품들이 많았으나 과도한 힘이 들어가다 보니 자칫 겉도는 관념에 빠질 위험도 그만큼 높아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리듬과 이미지라는 시조의 두 근간을 토대로, 공감과 감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작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달의 장원작품으로 유순덕의 ‘겨울 배’를 올린다. 폭설 속에 정박된 선체에 자신의 인격을 투영시켜 내밀한 자의식을 읽어내는 솜씨가 돋보였다. ‘폭설의 밤’ ‘물속의 잠’ ‘설원의 기도’로 점차 심화되면서 ‘겨울 배’가 내면탐구의 ‘빈 배 한 척’으로 승화되는 마지막 수의 선명한 이미지 처리가 인상적이었다. 다만 큰 무리는 없었지만 시조의 기본 율격에 보다 더 엄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상 작품으로 선한 장옥경의 ‘항아리’는 지금껏 너무나 많이 다루어져서 진부할 수 있는 흔한 소재인 ‘시골집 마당가 빈 항아리’를 시적 대상으로 삼아 첫수에서는 ‘와불’이라는 회화적 이미지로, 둘째 수에서는 ‘하늘 종’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신선감이 떨어지는 발상과 안이하게 처리된 상상력의 부족이 아쉬웠으나 밝고 건강한 심상과 따뜻한 시선이 큰 호감을 얻었다. 그러나 첫수 결구의 ‘와불이여’라는 영탄의 호격조사가 시적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흠으로 지적되었음을 밝힌다.
차하 작품으로는 이중원의 ‘수중도시’가 선에 들었다. 시조의 전형인 단수시조의 절제미를 잘 살린 작품이었다. 먼저, 비 오는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을 ‘수중도시’라는 함축적 표제로 삼은 것과, 유리창에 빗방울이 튀었다가 흐르다가 번져 내리는 과정을 ‘작은 탄성’ ‘밀려나간 손짓’ ‘물빛에 잠긴 도시’라는 섬세한 감각으로 읽어내고 있음이 흥미로웠으나 지극히 소품에 머문 느낌이다. 앞으로의 정진을 기대한다.
심사위원 : 이달균·박권숙 (대표집필 박권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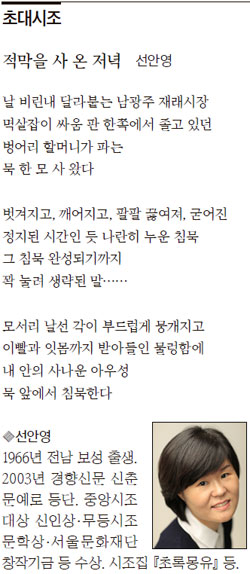
아무도 긴장하거나 기대를 갖지 않는 맛, 혀끝을 요동치는 자극도 매혹도 없는 무심하고 그저 그런 듯한 메밀묵 맛은 반면, 유년의 모든 추억을 평정하기도 한다. 눈 오는 깊은 겨울밤, 그 맛과 향수에 묻어나는 침묵이나 적막은 ‘지극한 평화로움’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묵 한 모’의 값으로 ‘벙어리 할머니’의 쓸쓸한 ‘적막’을 사 온 어느 저녁, 메밀묵채 한 그릇 버무려 놓고 식탁 모서리께 내려앉은 화자의 적막도 ‘내 안의 사나운 아우성’에서 멀찌감치 비껴나 있을 것이다. 애초의 메마르고 견고한 열매의 적막으로부터 ‘벗겨지고, 깨어지고, 팔팔 끓여져, 굳어진’ 끝에 그리도 물렁하고 지순한 적막을 얻은 묵 맛이라니.
볼 품 없는 묵 한 모가 쑤어내는 신산한 스토리는 ‘침묵’의 첫물과 끝물을 보여주는 듯하다. 아우성치는 욕망을 누르고 생략하며 도달한 납작한 침묵의 몸통은 ‘참을 수 없이 부드러운’ 역설의 맛으로 입안에 든다.
밤이 길어지고 있다. ‘모서리 날선 각’을 뭉개고 ‘이빨’도 ‘잇몸’도 속절없이 초토화시킬 묵 한 그릇의 적막이 오진 겨울밤과 함께 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리라.
박명숙 시조시인
◆응모 안내=매달 20일 무렵까지 접수된 응모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