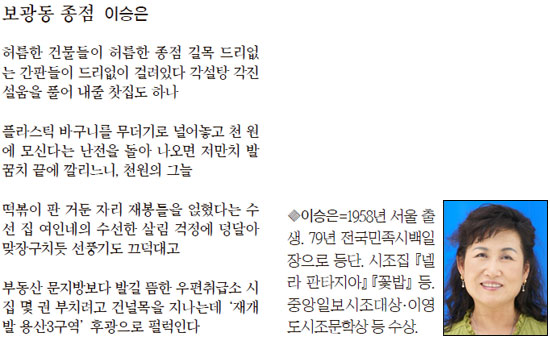
종점은 언제나 ‘설렘’과 ‘불안’과 ‘분주함’을 안고 있다. 막다른 곳에 이른 막다른 느낌, 그것은 막막한 정신의 바닥을 온전히 드러나게 한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당도한 곳, 삶의 종착역에 밀려온 사람들이 모래톱처럼 쌓여 사는 자리.
시인의 시선이 머문 ‘보광동 종점’은 인생이란 무시무종(無始無終), 끝이자 시작인 동시에, 시작도 끝도 없는 삶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찻집-난전-수선 집-우편취급소를 파노라마로 훑고 지나는 어안(魚眼)렌즈처럼 시인은 풍경의 안팎을 들여다 본다. 하지만 시집을 부치러 가는 우편취급소 건너편에 후광으로 펄럭이는 재개발 안내 현수막은 종점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준다.
표현 면에서도 시인이 농처럼 던지는 능란한 수사(修辭)가 시의 탄력을 더해준다. 첫 수의 ‘건물들이’와 ‘드리없는’의 발음의 유사성, 셋째 수의 ‘수선한 살림’과 ‘수선 집’의 동음이의어를 바탕으로 한 언어유희와, 각 수마다 동음어의 반복을 통한 리드미컬함이 그러하다.
‘보광동 종점’은 기실은 손금처럼 얽힌 일상을 살다가 우리가 이르게 되는 도처가 종점이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이렇듯 삶의 풍경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며 시조의 징검다리를 놓는 시인. 삼십 년 넘는 시력에 걸맞게 시조의 빗장을 열고 지를 줄 아는 그를 이 시대의 시인의 자리에 앉힌다.
오승철 시조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