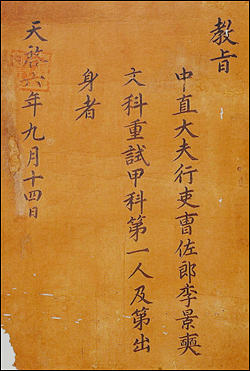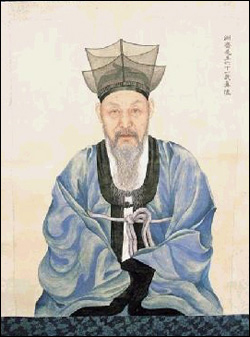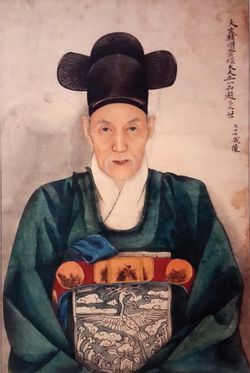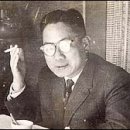칠연의총 위치, 문화재 지정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608 (안성면) [칠연의총] 전라북도 기념물 제27호(1976.04.02 지정) 칠연의총은 한 말에 일본군과 싸우다 목숨을 잃은 의병장 신명선(申明善)과 그의 부하들이 잠든 곳이다. 시위대 소속 군인이었던 신명선은 순종 융희 원년(1907) 정미칠조약이 체결되어 우리의 군대가 해산 당하자 무주에 들어와 덕유산을 거점으로 의병을 모집, 무주·장수·순창·용담·거창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면서 많은 공을 세웠다. 융희 2년(1908) 4월 신명선은, 계속된 전투로 인해 피로에 지친 부하들과 함께 이곳 칠연계곡 송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일본군에게 기습을 당하였다. 이에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으나, 숫적인 열세로 150여 명의 대원과 함께 장렬..